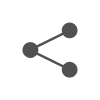광복 78주년을 맞이하여 시골집 텃밭의 흙 다시 만져본 후 JC K의 낙서
오래전 직장생활(職場生活)에서 자유(自由)의 몸이 된 후(後)에도 나의 영원(永遠)한 반려자(伴侶者)인 장모딸 덕분(德分)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 개의 직함(職銜 목사, 장로, 집사)을 가지고 왕성(旺成)하게 활동(活動)하고 지내는 간 큰 삼식(三食)이는 지난 4~5년 동안 장모딸과 함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시골 이랑 부산을 왔다갔다 하면서 시골 생활(生活)에서 다소(多小) 도시와의 차이점(差異點)을 느꼈다면?
※老婆心
목사: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장로(노): 장~~ 노는 사람
집사: 집에서만 사는 사람
도시에서는 불특정(不特定) 다수인(多數人)을 만나며 살아가다보니 타인(他人)의 삶에 크게 관여(關與)하지 않지만 시골에서는 특정(特定) 소수인(小數人)과 어울려 수십 년을 함께 살다보니 누구집에 속옷이 몇개고, 숟가락이 몇개고, 젖가락이 몇개 등등 타인(他人)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 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장단점(長短點)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은 관심(關心)과 정(情)이 너무 넘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생활(私生活) 면에서 지나친 의견(意見)을 내세우며 과도(過度)한 관심(關心)이 타인(他人)에 대한 사생활(私生活)의 침해(侵害) 및 불쾌(不快)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認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생활화(生活化)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시골은 도시(都市)보다 주위(周圍)에 관심(關心)을 둘 만한 것이 적다보니 마을쉼터 및 골목길 등에 노인(老人)들이 모이게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네집 누구는 이러쿵 저러쿵 등이 대화(對話)의 화제(話題) 입니다.
예를들어 누군가 어느집 자식(子息)들은 주말(週末)만 되면 부모님(父母-)을 찾아뵙고 농사(農事)일을 도와준다 등등 칭찬(稱讚)을 하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불쑥 나타나 항상(恒常) 부정적(不定的)인 말과 험담(險談)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내로남불(我是他非)인 사람이 간혹(間或) 있다는 것이 옥에 티입니다.
그러다 보니 칭찬(稱贊)이란 녀석은 험담(險談)에게 떠 밀려 꼼작달삭 못하고, 험담(險談) 이라는 녀석은 누군가의 발빠른 고자질(告者-) 선수(選手)에 의해 침소봉대(針小捧大)되여 걷잡을 수 없는 속도(速度)로 전달(傳達)되어 분란(紛亂)을 일으키는 경우(境遇)가 있습니다.
타지역(他地域)에 귀농 귀촌(歸農歸村) 한 사람들의 말을 종합(綜合) 해보면 조상(祖上) 대대로 마을에 터잡고 사는 원주민(原住民)이 거주(居住)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거리를 두고 주거지(住居地)를 정하던지 아니면 귀농 귀촌인(歸農歸村人) 들만 전원(田園) 마을로 구성(構成)하여 거주(居住)하는 것 또한 원주민(原住民)과의 생활방식(生活方式)의 이해충돌(理解衝突) 등 염려(念慮)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반려자(伴侶者)인 장모딸과 함께 면 소재지(面所在地)에서 시오리(十五理) 떨어진 두메산골을 자주 찻게 되는 것은?
낮에는 뜨락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 ~, 밤이면 어렸을 때 우리가 뛰어놀던 동구밖(洞口-) 그 자리에서 짝을 찾는 노루와 고라니들의 울음소리 들으면서 공기 좋고, 물맑고 인심(人心)까지 좋은 나만의 휴식처(休息處)에서 텃밭을 가꾸며 생활(生活)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이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까》
ㅡ혜민 스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中에서ㅡ
사람은 누구나 저 자신 뿐만 아니라 장단점(長短點)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 하기를 줄여야 합니다. 남의 좋은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지 아니면 남에 대해 말하기 보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 속담(俗談)에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라는 명언(名言)이 있습니다. 어른이란 쓸데없는 참견(參見)보다 실질적(實質的)인 도움을 주는 존재(存在)여야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하더니만,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는 명언(名言)이 궁금해서 자료(資料)를 뒤지다가 ‘유대인 속담(俗談)’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전(生前)에 관직(官職)이나 벼슬이 없었던 고인(故人)의 지방(紙榜)에 ‘학생(學生)’이라는 단어(單語)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이승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저승에 가셔도 배우라는 뜻인가 봅니다.(個人 思考ㅋㅋ)
이 사회(社會)에서 참다운 어른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법(方法)은 있습니다. 가장 큰 어른은 입은 닫고 지갑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생(學生)이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모임 등에서 대화(對話)를 나두다가 보면 상대방(相對方)의 이야기 도중에 끝까지 경청(傾聽)하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여 진로(進路)를 방해(妨害)? 하거나 간혹(間或) 남의 단점(短點)을 무심코 하는 경우(境遇)가 있습니다. 돌아서서 귀가(歸家)길에 이 시간(時間) 이후로는 조심해야지 후회(後悔)한 적을 생각하면서 처남댁(ㅈㅇㅎ) 께서 보내주신 책<정혜신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를 한 번 읽은 후 책장 깊숙히 잠 자고 있는 것을 꺼집어내어 다시 읽다보니 마음에 와 닿는 글(만성적 ‘나’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올려봅니다.
<만성적 '나'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
어느날 SNS를 통해 알게 된 모임에 참석했던 지인이 불평했다. 모임에 온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조급해하니 대화가 지나치게 전투적이고 재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최소 일곱 명 정도의 패널이 등장해서 서로 말할 기회를 잡느라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도 아닌데 일상에서 ‘나 드러내기’에 여념없는 사람이 참 많다.
공을 뺏기지 않으려고 현란한 드리볼을 구사하는 농구 선수와 그 공을 빼앗으려는 상대팀 선수의 조합처럼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 얘기로 화재를 돌린다. 동창 모임처럼 수평적 관계에서도 그렇다. 귀가길에 ‘내가 너무 혼자 말했나’ 후회가 밀려들기도 하지만 막상 그런 순간이 되면 통제가 안 된다.
기회가 왔다 싶으면 예의를 차릴 여유가 없다. 과도한 나 드러내기는 평소에 한 개별적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한채 방치된 삶들이 많아서라고 생각한다. 만성적인 ‘나’ 기근이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 中에서-
오늘의 명언/마음의 거리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의 30센티미터밖에 안되는 거리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 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류시화의(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