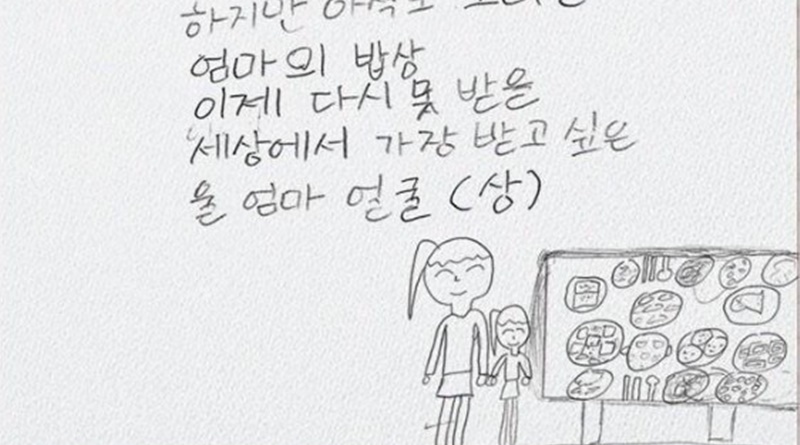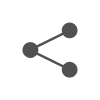‘가장 받고 싶은 상’
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 하며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한 편의 시가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올해 전북
부안여중 신입생인 이슬 (13) 양.
이양은 지난 해 2학기
연필로 쓴 시 로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한 2016년 글쓰기
너도나도 공모 전에서
동시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도교육청
블로그에
이 시를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심사위원을 맡았던 임미성
익산성당초등교 교감은
“동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사위원 세 명이 작품을 고를 때 만장일치로
가장 좋은 작품 으로
뽑았다.
무엇보다도 일기처럼
써내려간
아이의 글씨와,
지웠다 썼다가 한
종이 원본이 정말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말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세 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이슬 양의 시, <가장받고 싶은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