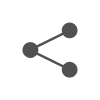☺ 부지깽이가 그리움을 부르네 😄
지금은 땔감을 쓰지 않으니
부지깽이가 사라진 시대이다.
수 천년을 우리의 어머니들은
부엌 (경상도에서는 ‘정지’)에서
땔감을 뒤적일 때는
부지깽이가 필요했다.
공간을 만들어 산소가
공급되면 불이 확 붙는다.
불쏘시개는 바싹마른
솔잎(갈비)이 으뜸이었다.
초목근피를 했으며
민둥산이어서
솔잎도 무척 귀한 시대였다.
부지깽이는
끝이 까맣게 타 있어서 바닥에
낙서도 하고 그림도 그렸다.
여름 한철 저녁 한 끼는
주로 국수로 때우기 십상이었다.
마당에
멍석을 깔아 놓고
모깃불을 피운다.
국시를 버지기에 담아서
한 그릇을 비우고 더 먹는다.
애호박을 넣고 끓인
안동 건진국수는
지금은 브랜드화 된
전국적으로 유명음식이 되었다.
형수님께
국수꼬리를 얻어 먹기 위하여
나는 부엌에 불도 봐 드리고
애호박도 따다 드렸다.
국수꼬리는 달궈진
불위에 굽기 위해서는
부지깽이를 써야한다.
그러면
중간이 붕떠서 씹어 먹으면
참으로 맛이 있었던 간식이었다.
내가 4살 때 시집오신
큰 형수님께서는
여든 중반이 되셨다.
시골에 귀향하여
형님 내외분이 사시는데
어제는 형수님과
한참 동안 통화를 하였다.
4살 때니 나의
아랫도리를 다 보았다고
결혼후
아내에게 얘기하시어
한바탕 웃기도 했다.
나는 여름밤의 모깃불은
모기가 연기를 피하여
도망을 가는 줄 알고 있었다.
그게 아니었다.
멍석에서 떨어진 곳에
모깃불을 피워 놓으면
모기가 연기를 좋아하여
그 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몇 년전에 알았다.
재미작가 김은국(작고)은
”빼앗긴 이름(Lost–names)”에
한 여름밤 멍석에서
국수를 먹는 장면이 나온다.
소가 파리를 쫒기 위하여
꼬리를 흔들고 머리를 움직이면
워낭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도 있다.
노벨상 후보에도 올랐었는데
그만 일찍 작고하고 말았다.
쇠꼬챙이로 된 부지깽이도
자꾸만 들쑤시면 닳는다는 말이 있다.
이제는 부지껭이를 쓸 일도
국수꼬리를 구워먹을 일도 없다.
아련한 추억속에 남아서
향수를 불러 일으킬 뿐이다.
부지깽이 쓰던
시대가 더 없이 그립다.
저녁 연기가 온동리에 퍼지면
마을엔 한마리의 개가 짖으면
덩달아 온동리 개가 다 짖는다.
컹컹거리며 울린다.
그 소리가 좋다.
개구리가 합창을 하면
박자가 어찌 그리도 잘 맞는지
지휘자 없어도 개구리는 하모니를
잘 이루어 내는 음악의 귀재였다.
참으로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아련히 떠 오른다.
그 느낌만으로도 꿈속같이 달콤하다.